 박재영 블럭에프에스 대표 "좋은 재료 고집했더니 가맹점 70개로 늘었죠"
박재영 블럭에프에스 대표 "좋은 재료 고집했더니 가맹점 70개로 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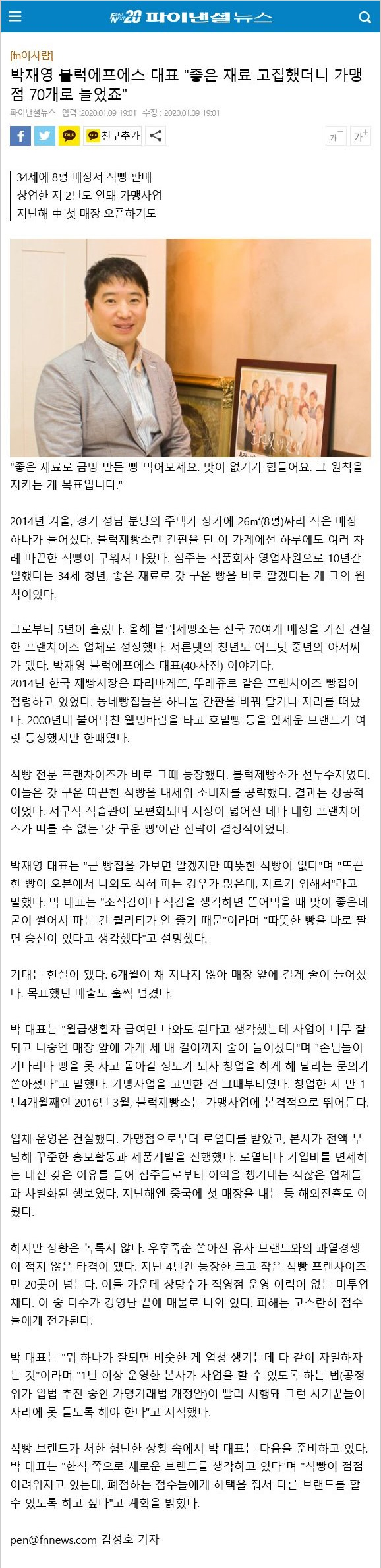
34세에 8평 매장서 식빵 판매창업한 지 2년도 안돼 가맹사업지난해 中 첫 매장 오픈하기도
2014년 겨울, 경기 성남 분당의 주택가 상가에 26㎡(8평)짜리 작은 매장 하나가 들어섰다. 블럭제빵소란 간판을 단 이 가게에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따끈한 식빵이 구워져 나왔다. 점주는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10년간 일했다는 34세 청년, 좋은 재료로 갓 구운 빵을 바로 팔겠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올해 블럭제빵소는 전국 70여개 매장을 가진 건실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다. 서른넷의 청년도 어느덧 중년의 아저씨가 됐다. 박재영 블럭에프에스 대표(40·사진) 이야기다.
2014년 한국 제빵시장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점령하고 있었다. 동네빵집들은 하나둘 간판을 바꿔 달거나 자리를 떠났다. 2000년대 불어닥친 웰빙바람을 타고 호밀빵 등을 앞세운 브랜드가 여럿 등장했지만 한때였다.
식빵 전문 프랜차이즈가 바로 그때 등장했다. 블럭제빵소가 선두주자였다. 이들은 갓 구운 따끈한 식빵을 내세워 소비자를 공략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구식 식습관이 보편화되며 시장이 넓어진 데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따를 수 없는 '갓 구운 빵'이란 전략이 결정적이었다.
기대는 현실이 됐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매장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다. 목표했던 매출도 훌쩍 넘겼다.
박 대표는 "월급생활자 급여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되고 나중엔 매장 앞에 가게 세 배 길이까지 줄이 늘어섰다"며 "손님들이 기다리다 빵을 못 사고 돌아갈 정도가 되자 창업을 하게 해 달라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가맹사업을 고민한 건 그때부터였다. 창업한 지 만 1년4개월째인 2016년 3월, 블럭제빵소는 가맹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업체 운영은 건실했다.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았고, 본사가 전액 부담해 꾸준한 홍보활동과 제품개발을 진행했다. 로열티나 가입비를 면제하는 대신 갖은 이유를 들어 점주들로부터 이익을 챙겨내는 적잖은 업체들과 차별화된 행보였다. 지난해엔 중국에 첫 매장을 내는 등 해외진출도 이뤘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후죽순 쏟아진 유사 브랜드와의 과열경쟁이 적지 않은 타격이 됐다. 지난 4년간 등장한 크고 작은 식빵 프랜차이즈만 20곳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직영점 운영 이력이 없는 미투업체다. 이 중 다수가 경영난 끝에 매물로 나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된다. 박 대표는 "뭐 하나가 잘되면 비슷한 게 엄청 생기는데 다 같이 자멸하자는 것"이라며 "1년 이상 운영한 본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빨리 시행돼 그런 사기꾼들이 자리에 못 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빵 브랜드가 처한 험난한 상황 속에서 박 대표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식 쪽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다"며 "식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폐점하는 점주들에게 혜택을 줘서 다른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